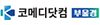침상에 묶인 환자, 복도에서 사망…책임은 누가?
[유희은 의료소송 ABC]
30년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 씨.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해왔다.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지난 2018년 4월 중순. 자신의 증상이 나빠졌음을 느끼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다. 입원 후에도 증상 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식사량이 줄어들며 열까지 치솟았다. 병원은 해열진통소염제 주사와 수액주사를 처방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에게 이는 충분하지 않았다. 상황은 더 나빠졌고,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여긴 의료진은 그의 양손을 침상에 묶어 강박 조치했다.
그리고 격리실이 다 찼다는 이유로 A 씨의 침대를 병실 밖 복도에 격리했다(의료법상 병실이 아닌 곳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A 씨는 침상 강박 상태로, 입원실이 아닌 복도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졌다. 밤이 깊어 병원은 불을 껐고,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다음날 한밤중이던 오전 2시 무렵이었다.
유가족은 황당했다. 입원실도 아닌 병원 복도에서, 그것도 침상에 두 손이 묶인 채,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실에 분노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 유족은 “의료진이 그를 방치했다”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종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유족은 승복할 수 없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가 중재를 신청했고, “병원이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병원은 중재원의 그런 결정조차 거부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중재는 최종 결렬됐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법원은 “의료진이 A 씨를 잘못된 장소에 격리 조치를 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위급 상황이 됐는데도 환자 발견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지침 지키지 않았던 병원에 “손해 배상하라” 판결
그리고 “강박 조치를 당한 환자는 활력 징후는 1시간마다 점검해야 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 다리를 움직여주어야 하며, 수시로 자세 변동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잘못을 추가로 지적했다.
당시 의료진은 1시간마다 A 씨의 활력 징후를 점검하지 않았고, 특히 새벽 2시부터 5시 36분까지 3시간 이상 A 씨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은 2년 넘게 걸렸다. 법원은 결국 2020년 “병원은 A 씨 유가족에게 49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기일마다 A 씨 딸은 법정에 출석했다. 20대의 아기 엄마였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던 날, 딸은 “아버지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법은 물론, 관련 지침이나 규칙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지침들은 환자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강박 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그 지침에 따라 적절한 관찰과 조치를 반드시 해야 했다.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