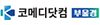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이렇게 땀 많이 흘렸는데”...소금 따로 먹어야 하나?
땀과의 전쟁이다. 불볕더위 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서 땀이 줄줄 흐른다. 벌써 티셔츠 가슴팍엔 땀이 흥건하다. 땀을 식히니 팔뚝과 뒷덜미에도 하얗게 소금기가 맺혀있다.
군대에서 행군을 앞두곤 일사병 열사병 예방한다고 소금을 미리 먹었더랬다. 지금은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지만 여름엔 땀이 많아진다. 거기에 나트륨, 염소, 젖산 등이 들어있다. 땀으로 배출되는 소금은 0.1∼0.2g 정도. 지금처럼 한여름철, 많이 흘릴 때는 1∼2g 이상도 나온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소금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황혜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평소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이미 체외로 배출된 소금의 양만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라며 “땀으로 배출되는 소금의 보충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소금의 주요 구성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恒常性) 유지에 꼭 필요하다.
또한,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장 및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 WHO 권고기준의 1.6배
한국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2,000mg(소금 5g)의 1.6배(3,274mg)나 된다.
2016년 3,669mg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인은 맵고 짜게 먹는 편이다. 그래서 굳이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
황 과장은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소금보다는 체내 수분 및 전해질 회복을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소금을 챙겨 먹는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으로 인해 이뇨제를 복용했거나 질환으로 인해 저염식이를 하는 등 기저 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식이요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 과장은 “과도한 소금의 섭취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신장과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과체중,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 특히 높은 온도에 장시간 운동이나 노동을 했다면, 소실된 전해질을 보충하는 이온 음료가 더 낫다.
반면, 커피 술 콜라 홍차 등과 같은 카페인 많은 음식은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