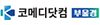심정지에서 살아나려면…CPR 다음 TTM까지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CRP)을 받았느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1차 관문. 문제는 그렇게 살아나더라도 대개는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까지 예방하자면 저(低)체온 치료가 필수다. 뇌와 신체 장기들에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생기는 ‘저(低)산소증’을 예방하는 것.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1차 관문이라면, 저체온 치료는 뇌 기능 손상을 막고 치료 예후를 좌우하는 2차 관문인 셈이다.
보통 ‘저체온 치료’라고도 불리는 ‘TTM'(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목표체온유지치료)은 체온을 1도 낮추면 뇌 활동이 6%가량 줄어드는 특성에 기반을 둔다. 체온을 낮춰 신진대사를 줄이면 뇌세포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TTM은 환자 체온을 낮춰 24시간 유지한 뒤 72시간에 걸쳐 0.25도씩 단계적으로 체온을 정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원에선 피부 표면에 체온을 낮추는 젤(gel) 패드를 부착하거나 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해 체온을 낮춘다.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현장에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젤 패드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심폐소생술에 저체온 치료 덧붙이면 더 많은 생명 구해
지난 7월 31일, 심정지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젊은 환자가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이 병원 중환자실 최재영 과장(중환자의학과)은 환자에 인공호흡기를 붙인 뒤 TTM도 즉시 시행했다. 환자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 앞머리에 EEG(뇌파) 패턴과 스펙트로그램(색 밀도 스펙트럴 어레이)도 쟀다.
이틀 만에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다. 뇌와 장기에 미칠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것. 최 과장은 6일 “이 환자는 앞으로 신경학적 예후 또한 양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TTM 치료를 받은 25~30%가 뇌 손상 없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3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TTM은 심정지 환자의 예후 관리에 핵심적인 치료다. 미국심장협회는 ’2020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심장 기능이 재개된 뒤 곧바로 TTM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권고했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한심폐소생협회도 그에 맞춰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