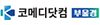엄마 아빠 야뇨증 있었으면, 아이도 야뇨증?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아직도 밤마다 소변을 지려 걱정이 크다. 엄마는 입학하기 전에 증상을 개선하려 아이를 새벽에 깨워 소변을 보게도 해봤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엄마도, 아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다.
5세가 되기 전까지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은 어쩌면 정상 발달 과정 중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발달지연 증상’의 하나이기 때문. 어린 시절, 방광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다.
그런데, 5세가 지났더라도 약 10% 정도의 소아에게서 야뇨증이 나타난다. 더 나이가 들어가며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중학교 다니는 15세까지 야뇨증이 있는 경우도 약 1%나 된다.
아직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방광 기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서적 문제나 수면 관련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가족력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임상 결과를 보면 부모 모두 야뇨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녀의 77%, 한쪽만 있었던 경우라면 자녀의 44%가 야뇨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이만 야단칠 일이 아니란 얘기다.
부모 모두 있었다면 아이도 77%는 야뇨증
많이 걱정이 된다면 비뇨기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면 좋다. 야뇨증 발생 빈도, 발생하지 않은 기간, 수분 섭취, 소변 횟수, 소변량, 변비 등 배변 양상, 수면 양상 등을 확인한다. 요실금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 소변검사나 요역동학 검사, 잔뇨 검사 등을 받아볼 수도 있다.
대동병원 비뇨의학과 서영은 과장은 “비뇨기계, 신경계 등의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전된다”면서도 “학교 등 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도 내버려 둘 경우엔 자신감 결여 및 수치심, 불안감 등으로 성장기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자애라고 더 민감한 건 아니다.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에 호통을 치거나 수면 시 기저귀를 채우고 새벽에 깨워 소변을 보게 하는 것 등은 잘못된 방법. 아이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한다. 아침이나 낮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저녁 식사 후엔 수분이 많은 음식은 자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빠를수록 좋고, 식단에 맵거나 짠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인다. 또 자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도록 하되, 만약 변비가 있다면 이것도 미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항이뇨호르몬, 방광이완제, 항우울제 등과 같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섣불리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땐 증상이 재발하기 쉬워 주치의 상담 후에 약물 복용 중단을 결정하는 게 낫다.
이와 함께 아이가 소변을 지리지 않은 날에는 듬뿍 칭찬을 해준다. 하지만 만일 소변을 지렸더라도 야단을 치기보다는 침구나 젖은 옷을 스스로 세탁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책임감을 늘려가는, 부모의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