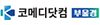환자가 죽겠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나?
[손춘희의 죽음과 의료]
오늘날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러면서 자연사는 없어지고, 모든 죽음이 병사나 사고사가 되었다. 태어난 자는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사가 없어지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할 때도 치료가 멈추지 않는다.
연명치료 거절이 법제화되면서 멈춰야 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법은 배우지 못한 채, 중환자실 앞 담당의사의 긴박한 설명만으로 결정하고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본 칼럼에서는 간단하게라도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 보려 한다.
1. "호흡기 떼달라"...연명치료 중단, 죽음의 선택인가?
2.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고?
3. 누가 연명치료를 의미 없다 하는가?
4. 죽겠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나?
5. 나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어떻게, 왜 해야 하나?
존엄사의 요지는 자연스러운 임종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지,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래전 카렌 퀸란의 부모가 얘기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때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한다. 그런 삶을 끝내기 위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대상자가 ‘실제 사망에 이르렀을 때’를 의사 조력자살 혹은 안락사라고 얘기한다.
본인의 요청도 없는데,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시행하면 살인이 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약을 대량 투여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면, 목적이 사망이 아닌 증상 경감이어서 안락사가 아니다.
살인과 안락사의 사이, 존엄사가 들어설 틈새엔
말기 폐암처럼 서서히 호흡곤란이 악화하는 질환에서 환자들은, 얼마나 살 것인가 보다 하루라도 숨이 덜 차도록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호흡곤란 완화는 포기하고 빨리 죽여달라고 한다. 독극물을 주사해서라도 죽여달라 한다.
그런 시간이 2, 3주일이 지나고서야 환자는 사망한다. 필자는 한 번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한 많은 분이 비슷하게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고민한다.
그러나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보다 못하다며 안락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울증을 치료하고 격려해야 할까, 자살을 도와줘야 할까? 비교적 일찍 안락사가 도입된 벨기에에서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 역시 가능하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손가락 하나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가 죽음을 택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1년 스위스에서는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고 있는 건강한 84세 여자의 안락사가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바람 외 다른 동기에 의해 안락사가 남용되거나 유도될 위험도 잠재되어 있다. 2007~2009년 벨기에에서 안락사한 시신의 폐를 적출해 장기 이식하니, 뇌사자에게서 적출한 장기 이식 때보다 경과가 좋았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7년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중국 내 사형수 장기 적출 때문에, 장기 기증이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0만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90%가 사형수 장기를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장기 이식이라는 이익을 위해 사형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는 이런 걱정에서 안전할까?
이런 위험에 대한 우려를 ‘미끄러운 경사’에 대한 걱정으로 비유한다. 경사길에서 한 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명백히 안락사가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쉽게 허용되기 어려운 이유다.
무지개의 끝은 빨간색과 보라색이 명확하지만, 어디서부터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바뀌는지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우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면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나라다. 안락사를 강요당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말기 질환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완화 의료나 호스피스 제도 역시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상의 모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다. 어떤 정도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것인가는 그 사회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도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