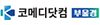연명치료가 의미 없다고?
[손춘희의 죽음과 의료]
오늘날 한국인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러면서 자연사는 없어지고, 모든 죽음이 병사나 사고사가 되었다. 태어난 자는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사가 없어지니,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할 때도 치료가 멈추지 않는다.
연명치료 거절이 법제화되면서 멈춰야 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법은 배우지 못한 채, 중환자실 앞 담당의사의 긴박한 설명만으로 결정하고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본 칼럼에서는 간단하게라도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 보려 한다.
1. 연명치료 중단, 죽음의 선택인가?
2.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고?
3. 누가 의미 없다 하는가?
4. 죽겠다고 한다면 죽일 수 있나, 안락사란?
5. 나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어떻게, 왜 해야 하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를 유보하기로 할 때 ‘무의미’한 치료라는 표현을 한다. 세상만사 모든 일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을 듯한데 어떤 치료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먼저 알아야겠다.
출생 당시부터 뇌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경우를 무뇌아라고 한다. 무뇌아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고, 대부분 출생 수 시간에서 수일 내 사망한다.
1992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생 전 초음파로 무뇌아를 확인하고 낙태를 권유하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출산했던 무뇌아(Stephanie Keene)가 있었다. 의료진은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치료를 중단하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도록 권유했으나, 부모들은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계속하기 원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는 계속되었고, 이 아이는 가장 오래 생존했던 무뇌아로 기록되었지만, 2년 174일째 사망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논하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할 말기암 환자도 모든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까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진료 기회의 공정성만으로 결정할 간단한 일은 아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구분하는 3가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치료라고 얘기하는 의료행위가 있다. 무슨 방법을 써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경우인데 몇 가지로 나누어 얘기한다.
첫 번째는 ‘생리학적으로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physiologic futility)’인데, 어떤 방법으로도 곧 닥쳐올 임종을 막거나 늦출 수 없을 때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이 생겨서 뇌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정도의 중상을 입은 정도를 얘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probable futility)’이다. 예를 들면, 90세 노인이 폐렴에 의한 패혈증 때문에 신장과 간이 망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인공호흡기를 최대한 가동해도 신체 산소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소생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수준의 치료를, 언제까지 할 때를 무의미하다고 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낮은 확률을 그렇게 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qualitative futility)’이다. 5년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비-위 영양관으로 살아만 있을 뿐 삶의 즐거움이 없어 보이는 낸시 크루잔(Nancy Cruzan)의 예가 될 것이다. 낸시의 부모는 이런 치료를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무뇌아(Stephanie Keene)의 부모 생각은 달랐다. 법원의 판단도 반대였다. 왜 그랬을까?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사이에서 맴도는 결정...사전의향서가 갖는 한계도
“이 옷은 빨간색이다”와 같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판단을 ‘사실판단’이라고 하며, “나는 빨간 옷을 좋아한다”와 같이 개인의 선호나 신념에 따르는 판단을 ‘가치판단’이라고 한다.
의료행위는 어떤 처치를 하면 어떤 결과와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의료진의 ‘사실판단’과, 그 과정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결과가 내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 판단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는 없다. 최종 결정은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의료진은 과거의 연구 자료와 개별 의사의 경험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추정, 제공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가 좋으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낸시는 평소에 그런 치료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부모에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의미한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삶이 좋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무뇌아는 어떨까? 무뇌아가 아니라도 이런 상황을 숙고해서 자기 뜻을 밝힌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결정해야 할까?
어떤 치료가 무의미할지는 각 사람의 살아왔던 여정과 경험, 그러면서 이루어진 가치와 신념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런 가치판단은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젊어서 딱하게만 여기던 노년의 불편함이, 나이가 들어 생각이 바뀌면 살아가는데 큰 짐이 아닐 수도 있다.
미리 작성했던 사전의향서가 앞으로의 내 가치판단과 같을까? 그마저도 남기지 않았다면 누가 결정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