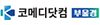퇴원하는 한쪽 마비 환자의 한탄, 가슴에 울려서...
[인터뷰] 봉생힐링병원 최용석 초대 병원장
“선생님이 제 몸은 잘 치료해주셨지만, 제 마음까지 치료해주진 못하셨어요.”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언젠가 한 퇴원 환자가 툭 던지고 간 한마디. 사고로 몸 한쪽이 마비된 환자였다.
부산 남구 감만동에 21일 문을 열 '봉생힐링병원' 최용석 병원장은 병원 시설(250병상· 지하 3층 지상 7층)을 설명하다 말고 불쑥 옛 얘기부터 꺼냈다.
얼마나 망설이다 그 말을 하게 됐을까?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뛰어넘어 환자 마음의 고통까지 '잘 이해하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더군요.”
봉생기념병원과 동래봉생병원을 운영하는 (의)정화의료재단(이사장 김남희)이 '재활 중심 회복기 전문병원'을 새로 만들며 그를 초대 병원장으로 선임했을 때부터 “이젠 꼭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런 환자들의 목소리가 마음에서 울려서였다.
봉생힐링병원은 뇌졸중, 척추손상, 암 등 환자가 전문 재활병원이 부족해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는 21일 최첨단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규모로 개원하는 재활의학 분야의 기념비적 병원이다.
"수술 등 (급성기)치료를 마친 '회복기' 환자의 기능을 잘 되살리는 게 게 '재활의사'의 첫째 미션이겠지만, 가정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이 빠져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환자 맞춤형의 입체적인 집중재활치료기관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최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제3단계) 핵심 목표와도 닿아있다.
“최근 재활병원은 예전에 비해선 많아졌지만, 환자의 그런 두려움과 고통까지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는 병원과 의사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이라면 선뜻 하기 힘들었을,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다. 먼저, 병원 한 층을 완전히 텄다.
마치 커다란 헬스클럽에 온 듯 온갖 재활치료 기구들과 침대들이 비치돼 있다. 몸의 기능 재활을 돕는 갖가지 운동기구부터 치료실, 뇌 기능과 관련된 인지재활치료실까지.
거기다 최신 로봇재활실과 통증치료실, 그리고 척수 손상, 뇌졸중, 파킨슨, 뇌성마비 등 신경계치료실까지 두루 갖춘 다목적홀.
다른 층에 가보니, 이번엔 줄 지은 병실들 중간에 꽤 큼직한 공간이 또 있다. 집중진료 시간 외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곳.
“여기다 운동 프로그램, 노래부르기나 그림그리기 프로그램, 식탁에 앉아서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설겆이를 하는 등 퇴원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미리 연습해보는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몸에 마비 온 환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그는 이어 “한쪽 몸을 못 쓰는, 편마비가 온 환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연습해보는 거죠."
병실 층마다 건물을 쭉 두른, 라운드형 테라스도 비슷한 맥락. 그는 “주위 경치를 둘러보며 심리적 긴장 완화와 일상 복귀에 대한 의욕을 다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360도로 이어진 테라스를 돌며 매일 색깔부터 달라지는 산도, 바다도 볼 수 있다. 영도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심지어 멀리 대마도까지 보인다. 인근 주민들의 일상 모습, 바로 옆 학교(동항중학교)에서 울려퍼지는 학생들 노는 소리까지, 그 모두가 힐링의 순간이다.
물론 그의 1차 목표는 “환자의 후유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신경이 손상되면, 다양한 후유증과 합병증 위험도 커진다. 뇌졸중과 척수손상 재활 전문인 그가 대장항문 및 탈장 전문 서상익 명예원장(외과), 신장 및 혈액투석 전문 박용기 진료부장(신장내과)과 합을 맞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 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마음까지 어루만지려 한다”는 봉생병원 창설자 김원묵 박사(신경외과) 어록을 만나게 됐다. 어느 순간, 서로 통했던 셈이다.
봉생병원과의 첫 인연은 '우연'이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마쳐갈 즈음, 박창일 지도교수가 “전문의 따면 부산에 가서 일해보라” 권했다. 알고 보니 봉생병원 정의화 의료원장(전 국회의장)과 은사가 오랜 절친이었던 것. 박 교수는 나중에 세브란스병원장에다 세계재활의학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그 전까지 그에게 부산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 처음엔 “1~2년만 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다”던 것이 어느새 20년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 사이 부산에 이런 저런 정도 들었건만 여기 남구 감만동은 그에게 또다시 낯선 곳.
'시내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환자나 보호자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대뜸 “그렇지 않다. 여긴 부산의 속살이 숨어 있는 곳. 게다가 진짜 맛집은 어디 숨어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에게 다시 '10년 후 봉생힐링병원은 어떤 모습이겠느냐'고 물었다.
최 병원장은 척수장애인협회, 뇌졸중환자동우회 예를 들며, “장애인고용센터, 지역의료기관 등과 함께 재활 환자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시 일상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또 지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고 답했다.